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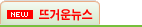
|

|

별기은제(別祈恩祭) 성황제(城隍祭)
등록일: 2012-10-16 22:42:23 , 등록자: 김민수 
별기은제(別祈恩祭)성황제(城隍祭)
별기은제(別祈恩祭)는 국가와 왕실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위하여 무격(巫覡)이 명산대천(名山大川)에서 지냈던 국행제(國行祭)이며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별기은제(別祈恩祭)는 별기은사사(別祈恩寺社)에서 행했던 불교의 불사(佛事)와 도교의 초제(醮祭) 형태로 행해졌다.고려국 고종 4년(1217)에는 나라에서 환란을 막고 외적의 퇴치를 기원하고자 별례기은도감(別禮祈恩都監)을 설치하였고 외산기은별감(外山祈恩別監)이 각처로 파견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산에서 별기은제를 치루었음을 알 수 있다.조선시대의 태조·태종·세종 대에도 별기은제를 올렸다. 고려시대에 별기은제를 지내던 명산대천은 덕적(德積)·감악(紺岳)·백악(白岳)·송악(松岳)·목멱(木覓)·개성대정(開城大井)·삼성(三聖)·주작(朱雀) 등 8곳이었으나 조선국 태조 대에 덕적(德積)·감악(紺岳)·개성대정(開城大井) 등 셋으로 한정하였으나 조선시대 말엽의 궁중(宮中) 발기를 보면 별기은제를 지낸 곳은 덕적(德積)·감악(紺岳)·개성대정(開城大井)으로 한정되지 않고 고양(高陽)·장단(長湍)고개·송악(松岳) 등지에서도 치성(致誠)을 드렸음을 알 수 있다.별기은제에 모셔지는 신격은 주로 높은 어실당·별군웅(別軍雄)·산마누라(山神)·왕신(王神)·국대부인(國大夫人)·자안아기시·호고아기시·말명·용왕(龍王) 등이다.
서낭제 또는 당고사(堂告祀)라고도 불리는 성황제(城隍祭)는 한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신(서낭신)께 드리는 제사이다. 마을 공동으로 성황제를 지내며 개인적으로 구복(救福)을 위해 지내기도 하였다. 마을 지명 가운데 서낭뎅이·서낭당고개·서낭나무·장승백이 등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성황제가 활발하게 올려졌다.개인적으로 성황당(城隍堂)에 제를 올릴 때는 해가 진 뒤 성황단이나 성황목(서낭나무) 아래에 제수를 진설하고 가정의 무병과 평안을 축원하였고 서낭나무 앞에서 무속인들이 굿을 하고 부인들이 기자(祈子)하는 풍속이 빈번했다.서낭신의 신체는 신목(神木)과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형태와 신당(神堂)을 설치한 형태가 있다. 성황당은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원추형으로 쌓은 돌무더기로 흔히 서낭당이라고 한다. 돌무더기 곁에는 신성시되는 고목나무나 장승이 세워져 있어 이곳을 지날 때는 돌 세 개를 얹으며 침 세 번을 뱉고 지나가면 재수가 좋다고 전해 온다.
성황제(城隍祭)는 신령을 섬겨 길흉(吉凶)을 점치고 굿을 주관하는 무속인들에 의해 성황굿(서낭굿)으로 행해지기도 하며 마을 전체의 행사로 유교식 제의의 형태로 올리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질병이나 액운이 있을 때 이를 풀어내기 위해 간단한 제수를 진설하고 정성을 올린다. 정월 14일에 부녀자들이 횡수막이를 한다고 가족의 옷 가운데서 동정을 뜯어 제물을 차리고 신목(神木) 아래서 정성을 드렸다.개인 제사를 올릴 때는 서낭나무에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쳐두거나 청옥색 헝겁을 둘러놓는다. 제물은 시루떡·삼색과실(三色果實)·북어를 놓고 밥그릇에 백미를 놓는다. 작은 상을 준비하거나 바닥에 흰 종이를 깔고 진설하며 촛불을 켜놓고 기원한 후 동서남북에 절하고 소지(燒紙)를 올린다. 제사가 끝난 후 시루떡을 떼어 나뭇가지에 북어와 함께 매어 두며 삼색과실(三色果實)도 그대로 둔 채 돌아온다.
|
|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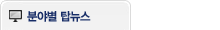

 칼럼/사설: 김선갑 전 광 ... 칼럼/사설: 김선갑 전 광 ...
 구정뉴스: 광진구, ‘재 ... 구정뉴스: 광진구, ‘재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열악한 광진 ... 구정뉴스: 열악한 광진 ...
 구정뉴스: 광진구, 2025 ... 구정뉴스: 광진구, 2025 ...
 구정뉴스: 뚝섬로 36가 ... 구정뉴스: 뚝섬로 36가 ...
 정계소식: 이정헌 국회 ... 정계소식: 이정헌 국회 ...
 정계소식: 오세훈 서울 ... 정계소식: 오세훈 서울 ...
 구정뉴스: 광진구, 지난 ... 구정뉴스: 광진구, 지난 ...
 구정뉴스: 광진구, 8개 ... 구정뉴스: 광진구, 8개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광진구, 자양 ... 구정뉴스: 광진구, 자양 ...
 구정뉴스: 화양동, 구의 ... 구정뉴스: 화양동, 구의 ...
 구정뉴스: 광진구, 버스 ... 구정뉴스: 광진구, 버스 ...
 구정뉴스: 광진구, 식품 ... 구정뉴스: 광진구, 식품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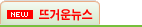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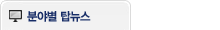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구정뉴스:
구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