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석희(擲石戲) 척석군(擲石軍)
등록일: 2012-11-11 12:13:31 , 등록자: 김민수 
척석희(擲石戲) 척석군(擲石軍)
http://blog.naver.com/msk7613
1394년 4월 1일 태조가 명하여 성중(城中)의 두 패로 나누어 서로 돌을 던져서 무예(武藝)를 겨루는 놀이 척석희(擲石戲)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척석군(擲石軍)이라 이름하였다.4월 3일 태조가 동량청(東涼廳)에 앉아 척석군(擲石軍)을 불러 사열하고,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기(趙琦)에게 명하여 이들을 거느리게 하였다.1397년 7월 11일 순녕군(順寧君) 이지(李枝),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 첨절제사(僉節制使) 전영부(全英富)·장철(張哲) 등을 해로(海路)로 보내어 갑사(甲士)·척석군(擲石軍)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조선국 연안(沿岸)을 상륙하여 많은 인명(人命)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하던 왜국(倭國)의 해적(海賊) 왜구(倭寇)를 쫓아 잡게 하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근(李懃)에게 명하여 궁중의 술을 가지고 위로하여 보내게 하였다.8월 23일 전 판사 정점(鄭漸)으로 척석군(擲石軍)과 소모(召募)한 군사를 거느려 배를 타고 왜적을 잡게 하고, 친히 용산강(龍山江)에 거둥하여 보았다.1398년 5월 5일 태조가 궁성(宮城)의 남문에 거둥하여 돌을 던져 싸우는 놀이 척석희(擲石戲)를 구경하였다. 절제사(節制使) 조온(趙溫)은 척석군(擲石軍)을 거느리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근(李懃)은 여러 위(衛)의 대부(隊副)를 거느리고 좌우편으로 나누어 서로 공격하여 해가 질 때까지 하였으니 죽고 상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1421년 5월 4일 세종이 상왕 태종을 받들어 풍양궁(豊壤宮)에서 돌아왔다. 상왕이 연화방(蓮花坊)의 신궁(新宮)에 들었으니 신궁이 이 때에 비로소 낙성된 것이다. 정부·육조와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김승주(金承霔) 등이 신궁에 나아가 문안하였다. 상왕이 병조(兵曹)·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비서기관 대언사(代言司)에게 이르기를, “오늘 내가 주상(主上)과 같이 석전(石戰)을 보려 하나, 주상이 굳이 사양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봄에 무예(武藝)를 연습할 때에 또한 주상과 같이 갔는데, 지금 석전을 보는 것도 놀이하는 것이 아니고, 무재(武才)를 시키는 것이다. 또 내가 혼자 가면 적적하여 이야기할 자도 없으니, 경 등의 의사는 어떠한가.”하니, 병조 판서 조말생 등이 계하기를, “신 등의 의사도 또한 그러합니다. 전하께서 혼자 가시고 주상께서 따라 가시지 아니하시면, 실로 편하지 못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마지못하여 상왕을 받들어 종루(鍾樓)에 행차하여 석전을 보았다. 종친(宗親)과 입직(入直)한 총제(摠制)와 병조의 당상관과 육대언(六代言)이 종루(鍾樓) 위에서 모셨는데,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왼편은 방패(防牌)가 3백 여인이고 오른편은 척석군(擲石軍)이 1백 5십 여인이었다. 척석군은 고려 때에 설치된 것인데 근년에 와서 이를 폐지하였다가 지금 다시 예전 군졸을 거두어 모으고 또 사람을 모집하여 이에 충당하게 하였다.
지휘자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양편이 어울려 싸우게 하니, 방패가 번번이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 총제(摠制) 하경복(河敬復)·곽승우(郭承祐)·권희달(權希達)·박실(朴實)과 상호군(上護軍) 이징석(李澄石)·대호군(大護軍) 안희복(安希福) 등이 기사(騎士)를 거느리고 공격하였으나, 또 패하여 달아났다. 하경복(河敬復)은 돌에 맞아 구레나룻을 상하고, 박실(朴實)은 여러 군사에게 공격을 당하여 힘이 다하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 옥관자(玉貫子)를 보았느냐.”하니, 그제야 공격을 면하게 되었다. 척석군이 또 이징석(李澄石)이 탔던 말을 빼앗아 바치니, 상왕이 말하기를, “하경복(河敬復)의 무리가 크게 다치지나 아니하였는가.”하니, 하경복(河敬復) 등이 아뢰기를, “비록 싸움은 패하였으나, 상하지는 않았습니다.”하면서, 억지로 일어나 누(樓)에 올라왔다. 상왕이 방패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매양 이기지 못하느냐.”하니, 방패들이 꿇어앉아 아뢰기를, “저녁 놀이 눈부시게 비쳐오고, 바람과 티끌이 얼굴에 가득히 날아와서 돌을 보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명하여 장소를 바꾸어 싸우게 하고, 돌을 던지는 것을 금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치게 하니, 방패된 편이 또 이기지 못하였다. 상왕이 이르기를, “방패된 편을 나는 건장(健壯)한 보졸(步卒)로 알았더니, 실상 겁이 많고 용기가 없는 자이다.”라고 하면서, 척석군 40여 인을 뽑아서 방패된 편을 도와주게 하니, 앞장 서서 싸우는 자는 다만 척석군(擲石軍) 뿐이고, 방패는 모두 도망하여 숨고, 도망하지 않은 자는 다만 고함만 지르면서 성세(聲勢)만 도울 뿐이다. 상왕이 영을 내리기를, “맞아서 넘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치지 말라.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하면서, 또 의원(醫員)을 명하여 다친 자를 돌보아 치료하게 하고, 저녁 무렵에 이르러 그쳤다. 임금이 상왕을 받들어 신궁(新宮)에 이르렀다가 창덕궁(昌德宮)에 돌아왔다. 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서 문안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내 병은 벌써 나았다. 오늘 부왕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요사이 오래 되었던 병을 앓아 허리 근처가 습랭(濕冷)하더니, 지금 말을 타고 왔더니, 병이 조금 나았다.’ 하시므로, 나는 매우 기쁘다.”하니, 여러 신하가 모두 하례하였다.
5월 5일 상왕 태종이 종루(鍾樓)에 나아가 각(角)을 불게 하니, 군사들이 즉시 달려와서 영(令)대로 진(陳)을 쳤다. 세종이 창덕궁에서 각(角)으로써 마주 응하게 하였다. 상왕이 판병조사(判兵曹事) 이원(李原)과 병조 참의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창덕궁에 가서 세종을 맞아 오도록 하였다. 세종이 이에 창덕궁에 입직(入直)한 군사를 거느리고, 검은 옷을 입고, 오대(烏帶)를 띠고 우군(右軍)의 뒤로 나아가니, 상왕이 미리 병조 참판 이명덕에 명하여 아패(牙牌)를 가지고 군문(軍門)에 나가서 영접하여 들어오도록 하였다. 세종이 즉시 말에서 내려 명을 받고, 도로 말에 올라 군문(軍門)에 들어가서 상왕과 함께 종루에서 석전(石戰)을 보았다. 상왕이 친히 이원·조연·이화영(李和英)에게 명하여 삼군(三軍)의 장수로 삼아 직문기(織紋旗)를 내려 주었다. 군사들이 이미 영을 듣고는 감히 항오(行伍)를 이탈하여 문란한 행동을 하는 자가 없었다. 조금 후에 계엄을 해제하도록 명하고 인하여 석전(石戰)을 보는데 척석군(擲石軍)을 좌우대(左右隊)로 나누고, 잘 싸우는 자를 모집하여 이에 충당하였다. 좌군은 흰 기를 세우고, 우군은 푸른 기를 세워 표지(標識)로 하였는데, 서로 거리가 2백여 보(步)나 되었다. 영을 내리기를, “감히 기를 넘어가면서 끝까지 추격하지는 못한다. 기를 빼앗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이긴 편은 후하게 상줄 것이다.”하였다. 그런데, 좌군은 강하고 우군은 약하여 번번이 이기지 못하니, 권희달·하경복이 기사(騎士)를 거느리고 공격하였으나, 좌군이 굳게 막고 돌이 비오듯하여 희달이 돌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달아났다. 기사가 이를 분하게 여겨 고함을 치면서 추격하니 좌군이 무너지므로 이에 흰 기를 빼앗아서 바쳤다. 상왕이 좌군 패두(牌頭) 방복생(方復生)을 불러서 말하기를, “기를 빼앗긴 것은 치욕(恥辱)이니, 마땅히 다시 힘을 다할 것이다.”하였다. 복생 등이 용기를 분발하여 쳐서 크게 이겼다. 누 아래에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면서 종친·의정·육조 판서 등이 모셨다. 척석군(擲石軍)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면포 1백 필, 정포(正布) 2백 필과 저화(楮貨) 4천 장을 상으로 주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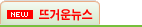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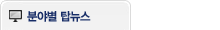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구정뉴스:
구정뉴스: